(편집부)=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2025-997)미수복 경기도 강원도 무형유산 신규 발굴 공고에 따른 지정 신청 관련 고증 의견서
주: 시도 무형유산은 각 시도의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검무 관련 평양검무니 진주검무니 하는것은 원래 있는 명칭이 아니나 행정적으로 종목 명칭 앞에 해당 지역명을 붙이는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의견서 첨부
<송도수박> 조사 보고서
중국 상해체육대학 남도희 박사
2025년 8월 11일
1. 종목 명칭
전통무예 가운데 대표적인 맨손무예다. 수박(手搏,手拍), 수박희, 슈벽, 수박(벽)치기, 수벽타(手癖打) 등으로 불렸다.
이들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표기가 나온 것이다.
2. 무형유산 부문
무형유산 분류체계에 따르면 수박은 무예에 해당한다. 개성의 수박이 무예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고려사에는 수박(手搏)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무사들의 무예 연마와 왕의 관람, 승진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고려사> 의종이 보현원(普賢院)에서 무신들에게 오병(五兵) 수박희를 하게 했다. 이의민(李義旼)이 수박을 잘해서 의종의 사랑을 받았다, 두경승(杜景升)이 공학군에 들어가자 수박하는 자가 경승을 불러 대오(隊伍)를 삼으려 했다. “왕이 상춘정(賞春亭)에 나가 수박희를 구경했다.”, “왕이 화비궁(和妃宮)에서 수박희를 구경했다.” 수박으로 이긴 군사에게 벼슬을 주었다(최충헌전).
기록으로 보아, 고려 사회에서는 수박이 매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개성의 수박은 조선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경제육전에 수박을 무과시험 과목으로 채택해서 갑사와 방패군을 뽑게했고, 수박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연회 때 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태종실록 10년)(세종실록 1년)(세조실록 5년).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한 2018전통무예 백서에 수박은 씨름, 활쏘기, 택견과 함께 전승 종목으로 구분, 발표됐고 무예로 되어 있다.
2019년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의한 전통무예 기초 조사때 과업 내용에 수박을 포함해서 조사하라고 용역 내용으로 공고했고 부문은 무예였다.
3. 송도수박의 전승 배경
개성의 수박(송도수박)은 전승계보는 물론 구체적인 동작, 기술들이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현재 전승도 이루어지고 있다.
해방전까지 개성에서 수박이 전해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 석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전때 몽둥이(곤봉)와 육박전이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서울과 평양의 석전에서 지역의 맨손무예들인 택견과 날파람이 석전 진행과정에 등장하는 것이 확인된다.
석전은 돌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으로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 기록이나 매일신보 기사 등으로 알 수 있듯 사상자가 많이 생겼던 전투였다. 수박이 석전에서 활용된 맨손무예였다는 것은 곧 수박이 무예였음을 확인해준다.
기능자 오진환과 송창렬 자료를 통해서 수박이 무예로 전승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왜정때 했던 수박 관련 증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면 사람이 죽는다대요?”라는 평안도 실향민 2세대 증언도 있다.
수박의 무예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석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개성에서 전해진 것으로 수박 외에도 석전(돌싸움)이 해방되기 5여년 전까지도 행해진 증언이 있다.
개성의 석전
석전(돌싸움)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전해진 습속이다. 고려사, 목은시고 등에 기록이 있고 조선 태조, 이방원, 세종 때 기록도 있다. 영조 1년 비변사등록 기사에도 개성에서 석전하는 것을 금지시킨 기록이 확인된다.
석전은 개성 외에도 평양과 서울에서도 했었다. 이때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서로 치는 것뿐 아니라 육박전을 같이 했는데 평안도에서는 날파람이라고 하며 개성에서도 수박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서울에서는 석전을 하며 택견을 했다고도 한다.
개성 출신 이상은씨(현 93세)는 개성에서 출생하고 남하했다. 1940년경 목격한 개성 지역의 석전을 증언했는데 음력 정월에 개성의 남대문에서 아래쪽 만년교(돌다리) 옆 훈련원 터의 밭부터 야다리까지 근 6백미터 거리에서 북부패와 남부패로 편을 갈라서 싸웠다고 한다.
대장격은 따로 없었고 “던져라!”는 소리에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참여 인원이 많을 때는 백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4. 송도수박 종목 및 전승자 지역성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 송도(개성)의 수박 관련 언급을 했다. <조선상고사>, 신채호, 1931년-『조선일보』 연재 송도(松都 : 開城)의 수박(手拍)이 곧 `선배’ 경기의 하나이니, `수박’이 지나에 들어가서 권법(拳法)이 되고, 일본에 건너가서 유도(柔道)가 되고, 조선에서는 이조에서 무풍(武風)을 천히 여긴 이래로 그 자취가 거의 전멸하였다.
수박이 개성 지역에서 전승된 것은 일제강점기 개성에서 출생하고 거주 및 활동했던 전승자들 인터뷰로도 확인된다.
충북 진천군 지원사업으로 국무논총 논문집 발간을 위한 연구에서 개성출신 오진환과 송창렬을 전,대한검도회 부회장(검도 8단) 김재일이 현장조사하고, 자료채집과 녹취를 했다. 태권도 국제사범(태권도 7단) 범기철 교수는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전통무예연합회를 결성하며 오진환과 송창렬을 조사했는데 수박이 적어도 일제강점기 개성에서 전해진 것이 복수의 증언자들로부터 확인됐다.
오진환(1919~2002, 개성 출생,개성시 남산동 거주), 전, 대한검도회, 우슈협회 부회장 검도 8단 김재일 인터뷰- 2001년 서울시 관악구 신림6동 오진환 자택
오진환, 태권도 국제사범(국기원 7단,미 아틀란타신학대학) 범기철 교수 인터뷰- 2001년 서울시 관악구 신림6동 오진환 자택
오진환, 송창렬(1932~2017, 개성시 만월정 거주), 범기철 교수 좌담회- 서울시 금천구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전통무예연합회 사무실
이 전통 수박은 왜정때도 민간에서도 행해졌음이 교차확인 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출생해서 수박을 증언하고 실제 동작을 보여줬던 인물들이 개성에 집중되어 있다.
수박을 언급한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481년- 충청도 은진현(恩津縣)과 전라도 여산군(礪山郡)의 경계 지역인 작지(鵲旨)에서 매년 7월 15일 근방의 두 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박희로 승부를 겨루었다.
<재물보(才物譜)>, 1798년- “수박-지금의 ‘슈벽’과 같다. 마땅히 이 글자를 써야 한다(手搏-仝今之슈벽當用此字)”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동죽지>, 1921년- 수벽타(手癖打) 舊俗有手術 古自劍技而來 對坐相打兩手去來 如有一手失法則便打倒 名之曰 수벽치기
“옛 풍속에 수술(手術)이 있는데 예전 칼쓰는 기술로부터 온 것이다. 마주 앉아서 서로 치는 손기술이 있는데 두 손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만일 한 손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곧 타도를 당한다. 이것을 수벽치기라고 한다”
<조선상식풍속>, 1946년 수박- “수지(手指)의 굴신과 권악(拳握)의 진퇴로써, 일정한 제약에 의하여 승부를 낸다”, 본래 무예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술자리의 여흥이나 아동들의 놀이가 되었다.
개성(송도)의 수박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신채호가 기록을 남겼고 조선 정조때 재물보 외에도 최영년은 해동죽지에서 최남선은 조선상식풍속에서 언급 했는데 지역이 개성과 무관하다 볼 수는 없다. 최영년은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개성 출신 오진환 얘기로는 일제강점기까지는 수원 일부와 인천 모래내 바닥 그리고 의정부지청(개성 재판소) 등도 개성권에 속했었다.
송도수박 전승지역
수박이 전해진 개성의 세부 지역은 아래로 확인됐다. 조사는 2001년과 2년에 걸쳐서 진행됐던 충북 진천군 지원 국무논총 논문집 수록을 위한 조사연구에 따른 것이다. 논문집은 2006년 대한체육회 연구상을 수상했다.
개성- 기무라산 약수터, 여우골, 홍삼정 뒤뜰, 남문통, 개성철도역 공원,
남산동, 민완식 남부유도관, 개성 시청 옆 연무대 등
개성 석전과 수박 전승자들 출생, 거주, 활동지 겹쳐!
일제강점기까지 개성에서 석전을 했던 지역과 수박을 했던 민완식, 오진환, 천일룡, 송창렬 등 출생, 거주, 활동지가 겹치는게 확인됐다. 석전과 맨손격투로써 각 지역에서 했던 것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일제강점기때 개성에서 석전을 했던 곳, 장소와 수박을 전승한 이들 출생, 거주, 활동지를 교차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개성 석전 장소(1940년경 증언)- 개성 남대문> 만년교, 훈련원 터로부터 야다리까지 6백미터, 남부패, 북부패로 편을 나눠서 했다.
개성 훈련원: 南部 곽장리(郭莊里)에 있던 武術演習場 때때로 弓術試驗을 보고 資格을 授與했다. 萬年橋 南方一帶
전승자 출생, 거주, 활동지
민완식(석전 북부,남부패 지역 활동)>동생 민관식(전,문교부장관)도 개성시 출생이나 정확한 동내까지는 불명확하다.
오진환– 남산동 출생,거주, 개성 남대문 아래쪽(석전 남부패 지역)
천일룡>개성 남대문 근처 남문통 시장 거주(석전 북부,남부패 지역)
송창렬>개성 만월정 거주(석전 북부패 지역)
5. 전승자 지역성
1911~1947졸 민완식- 개성 출생, 전 문교부장관 민관식의 형
1919~2002졸 오진환- 개성 출생, 개성 남산동 거주, 개성상업중학교 졸업
1900~1950졸 천일룡- 개성 출생, 개성 남문통 거주
1932~2017졸 송창렬- 개성 만월정 거주, 개성 만월국민학교
전승계보는 민완식>오진환과 천일룡>송창렬 두가지로 이어져 왔으나 2001년~2002년까지 충북 진천군 지원을 받아서 발간됐던 <국무논총> 논문집 조사, 연구때 오진환과 송창렬의 증언, 형태, 동작, 기술들을 교차검증 했었다. 논문집은 2006년 대한체육회 연구상을 수상했다.
개성 보부상들 수박 행위층으로 이해돼
개성에서 수박을 했던 행위층을 살펴볼 때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석전에 참가했던 개성 남대문 위쪽 북부패와 아래쪽 남부패에 수박 전승자들 출생,거주,활동지가 겹치는 것으로 보아 석전을 비롯해서 수박을 했던 이들로 개성 상인들(보부상)이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기능자 송창렬이 개성 남대문 근처 남문통 시장에 살았던 보부상 집안에 전해졌던 것을 배웠다는것과 기능자 오진환이 2002년 조사에서 “(개성 보부상패들이) 이따금씩 연습하는 것을 봤다!”, 평안도 실향민 2세대 증언으로 황해도에 수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전부 보부상,장돌뱅이들이었다!는 주요한 근거다.
6. 송도수박 보호 필요
송도수박은 개성지역에서 성행한 전통무예이다.
해방후에도 이어졌던 개성의 씨름(오른(바른)씨름), 관덕정 활쏘기 문화, 석전들이 모두 맥이 끊어진 지금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수박으로 서울 택견, 평안도 날파람들과 구분되는 전통무예다.
전통무예진흥법 연구 결과로 2018년 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한 전통무예 백서에 수박은 씨름, 활쏘기, 택견과 함께 전승 종목으로 구분, 발표됐다.
전승단체는 사)대한수박협회가 1종목 1단체 였고 신청인이 회장으로 개성의 수박을 전승하고 있다. 그 외에는 복원(18기, 24반무예, 마상무예), 창시, 외래무예로 발표됐다.
2019년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의한 전통무예 기초조사에 송창렬과 오진환 자료들이 조사자에 제출됐고 문화재청에서 검토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담당은 당시 수박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목록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2002년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전통무예대회에 오진환이 참석해서 “송창렬이 하는 것은 민완식 선생이 하던 것과 같은것!”이라 증언했고 다수 연구자들의 교차검증을 통해서 송도수박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는 것이 확인된다.
수박의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 개성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어 확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신채호 기록처럼 그때까지도 개성에서 전승되었었다. 해방 전까지 개성에서 했던 수박은 기능자 오진환, 송창렬 등이 남하해서 서울시 허가 법인 설립과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전통무예연합회 설립 참여, 공개대회 시연, 학술회 개최, 교육 등을 했고 전승활동을 확대했다.
수박은 미수복 경기도 개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국가기관과 사회적으로도 신청인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 조선족들에도 전통 수박 관련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가 없다.
북한의 경우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무예도보통지를 등재하면서 태권도의 기원이 수박이라고 국제 정보화했으며, 중국은 중국 문화부 주도로 산시성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문화공정에 이용하고 있다.
전승지역과 계보가 확실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분단 이후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과 택견, 씨름, 활쏘기 등이 국가무형문화재,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반면 수박은 아직까지 정부의 직접적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는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부족하다기보다 전문 연구가가 부족한 탓이 크다. 일제강점기까지 개성에서 전승된 수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 전승단절 될지 모를 위태한 상태다.
참고문헌 및 자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이성지 <재물보(才物譜)>, 신채호 <조선상고사>
최영년 <해동죽지>, 최남선 <조선상식풍속>
2001.2년 오진환, 송창렬 증언 녹취록
(2025년 공증,유앤나속기사무소)
2003년 충북 진천군 지원 국무논총 수박론
-수박 기능보유자 발굴에 즈음하여
2007년 추천서(문화재청 전승현황 등록신청)
– 택견 보유자 정경화, 태권도 9단 곽기옥
2013년 한겨레신문 “팔십 노인의 수박치기!” 기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 연구
– 송창렬 조사대상자 부분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2018전통무예 백서
2019년 문화재청 전통무예 기초조사 공고,현장조사 내용
2021년 문화재청 중국 수박 산서성 무형문화유산 지정 전문가 의견
전승자 송창렬 제적등본
KBS 방송 영상
EBS 방송 전문가 고증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전통무예대회 송창렬 시연 영상
충북 진천군 지원 송창렬 연구 인터뷰 및 시연 영상
한겨레신문사 촬영 송창렬 증언, 시연 영상
© 2025, 편집부.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기사)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5년 09월 12일 1:27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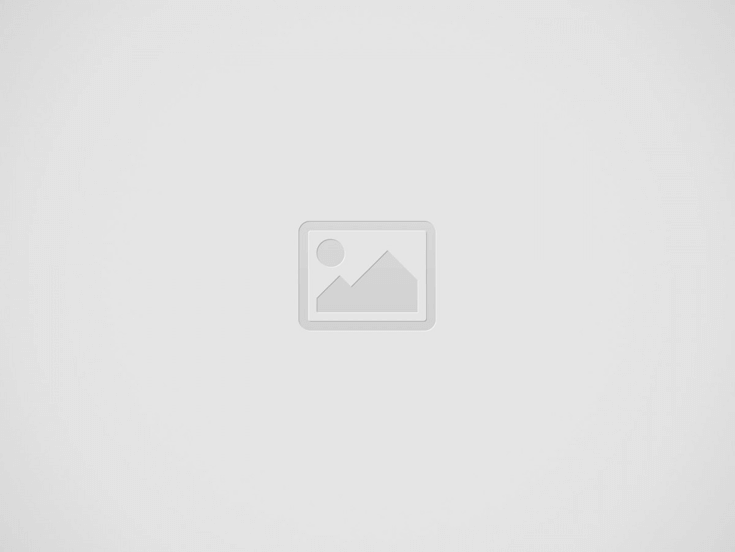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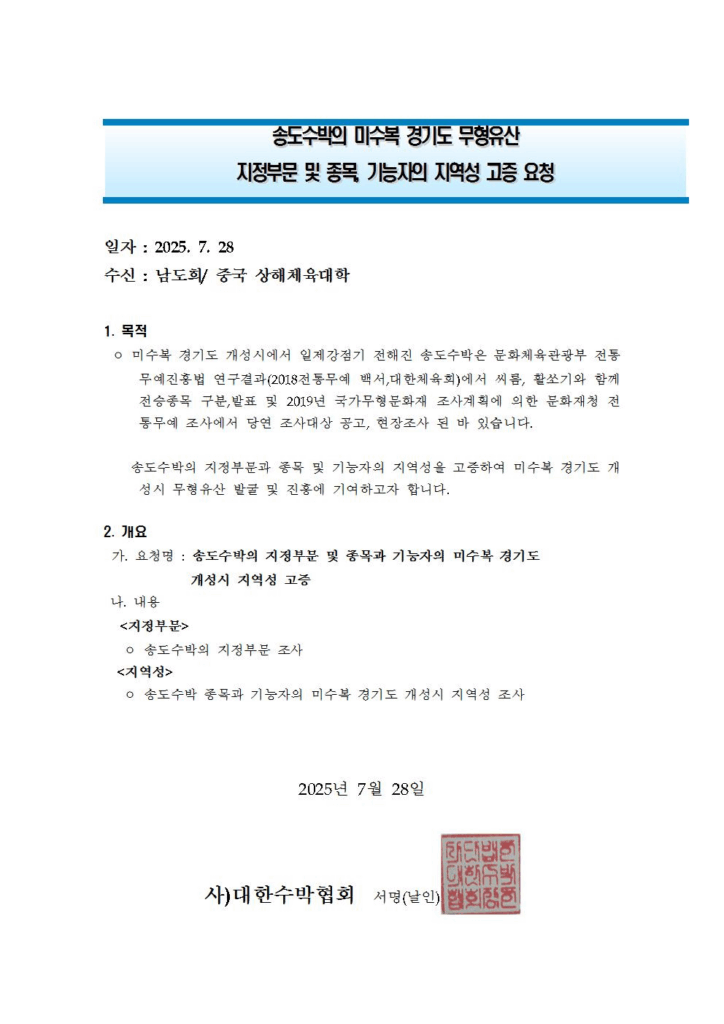
Leave a Comment